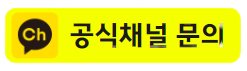출처: 토큰포스트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자산과 금융을 넘어 물리적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되며 ‘DePIN(탈중앙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이 주목받고 있다. DePIN은 중앙 집중형 방식이 아닌, 일반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물리적 장비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 권한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저장소, 통신 인프라 등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하지만 DePIN은 GPU, 저장 장치, 라우터, 카메라 등을 탈중앙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인프라의 소유와 운영 주체를 다변화하고 있다. 개인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물리적 인프라를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Web3 생태계의 실질적 확장으로 평가된다.
DePIN은 실제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무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미국의 Helium은 전 세계 100만 대 이상의 장비를 연결하고 있다. Helium은 통신 인프라를 개인이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보상받는 모델을 구현하며, 2024년에도 계속해서 커버리지를 확대 중이다.
AI 연산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PU 공유 플랫폼 Aethir는 2024년 말 기준 36만 개 이상의 GPU를 네트워크에 연결했으며, AI 개발 기업 및 연구기관에 탈중앙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저장 인프라를 제공하는 Filecoin은 2024년 기준 최대 1,900PiB의 저장 계약을 달성했으며, IPFS 기반의 검열 저항적인 데이터 저장 수단으로 활용된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Messari에 따르면, 2024년 DePIN 프로젝트는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5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0만 개 이상의 장치가 DePIN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며, 스마트시티, 커넥티드카, 에너지 그리드, 산업용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DePIN을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CoinGecko, Binance Research 등은 DePIN 프로젝트 전용 테마 페이지를 운영하며 시가총액, 유동성, 활성 노드 수 등 핵심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기준 DePIN 관련 토큰 상장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들의 토큰 이코노미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스타트업 제타큐브(ZetaCube)는 초소형 나노디핀센터(NanoDC)를 통해 도심 내에서도 설치 가능한 분산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과의 협업으로 AI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도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27일에는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DePIN Accelerator Korea Cohort 0’ 행사가 개최된다. 제타큐브, DePIN Association Korea, 토큰포스트가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DePIN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신 동향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Aethir, Filecoin 등 글로벌 대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한국형 DePIN 실증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제타큐브의 조정현 대표는 “한국이 DePIN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췄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률, 정책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DePIN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술 표준화와 제도 정비, 참여자 인센티브 마련 등 보완 과제도 동시에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현재 디지털 자산과 실물 인프라가 결합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DePIN은 블록체인 기술이 실물경제와 접점을 이루는 대표 사례로, 향후 한국이 이 흐름을 수용하고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