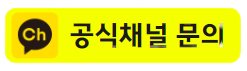출처: 토큰포스트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를 이용한 해킹 공격으로 620만 달러(약 90억 7,2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익명의 고래 투자자가 여전히 젤리(JELLY) 토큰의 총 공급량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록체인 정보 분석 업체 아컴(Arkham)에 따르면, 해당 고래는 하이퍼리퀴드의 청산 매개변수를 악용해 약 626만 달러(약 9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그는 5분 안에 세 건의 대규모 거래를 체결했는데, 각각 215만 달러(약 31억 3,900만 원)와 190만 달러(약 27억 7,400만 원) 규모의 롱 포지션, 그리고 이를 상쇄하는 410만 달러(약 59억 8,600만 원) 규모의 숏 포지션이었다.
이후 젤리 토큰 가격이 400% 급등하면서 400만 달러에 달하는 숏 포지션이 즉각 청산되지 않고, 하이퍼리퀴드의 유동성 공급자 금고(HLP)로 흡수됐다. 해당 금고는 대규모 포지션을 청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조사한 블록체인 분석가 잭XBT(ZachXBT)는 “하이퍼리퀴드에서 조작 행위를 벌인 주체와 연계된 다섯 개의 주소가 솔라나(Solana) 네트워크에서 여전히 젤리 토큰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가치는 190만 달러(약 27억 7,400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젤리 토큰은 2025년 3월 22일 이후 매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퍼리퀴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젤리 토큰의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 폐지 조치를 내렸다. 플랫폼 측은 “시장 조작의 증거가 발견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고래 주소들은 여전히 젤리 토큰을 매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밈코인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젤리 토큰 사건도 유사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하이퍼리퀴드가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 내 투기적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시장 조작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비트겟 월렛(Bitget Wallet)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앨빈 칸(Alvin Kan)은 “젤리 사건은 ‘기반 없이 조성된 유행’이 결국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며 “DeFi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관심이 빠르게 몰리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이퍼리퀴드의 비영리 조직인 하이퍼 재단(Hyper Foundation)은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피해 사용자들에게 자동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조작을 벌인 고래 투자자의 주소는 제외된다고 밝혔다.